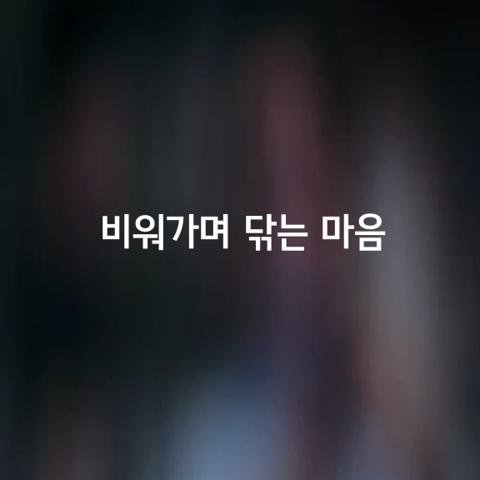
비워가며 닦는 마음
비워가며 닦는 마음
존재의 본질: 비움과 채움
진정한 삶이란 가득 채워져 더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아닌 ‘비워가며 닦는 마음’이라는 명제로 시작하는 이 글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시합니다. 지학 스님은 인간 마음의 본질을 담아내는 강렬한 은유를 사용하여 ‘비움’과 ‘채움’의 역설적인 관계를 탐구합니다. 채움에 대한 욕망이 내면을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을 유발한다는 관점을 강조하면서, 스님은 비워야만 진정으로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수함과 평화의 추구
글의 후반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비워가며 닦는 마음’이 지향하는 이상 상태를 묘사합니다. 스님은 내면의 평안과 가벼움을 ‘바싹 마른 참깨를 거꾸로 들고 털 때 소소소소 쏟아지는 그런 소리’에 비유하여, 내면의 부담과 잡念을 털어내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을 때 느끼는 해방감을 표현합니다. 수수함과 평화로 가득 찬 마음은 이웃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공간으로, 삶의 파도와 시련 속에서도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진정한 언어의 갈망
그러나 이러한 이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한 맺히게 울어대는 뻐꾹이 목청’에 비유하여, 인간의 언어가 종종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는 데 부족함을 시사합니다. 그는 죽은 에미의 젖꽂지를 물고 빨아내는 어린이의 울음소리에 자신의 언어를 비유하여, 우리의 표현이 종종 순수함과 진실성을 결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의 딜레마를 반영하며, 진정한 커뮤니케이션과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그러한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언어적 수단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면의 통합: 자아의 다양성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아의 다양성과 내면의 통합을 탐구합니다. 스님은 우리 안에 ‘수줍은 듯 숨어 있는’ 측면이 있으며, 그것이 역시 우리의 진정한 자아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과 구박하는 하인 모두가 변함없이 우리 자신이라는 인식은, 내면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우리 존재의 전체성을 포용하도록 초대합니다. 이러한 통합된 자아에서 비롯된 외침은 진정한 자아 표현의 형태가 되어, 채찍질과 헹굼을 모두 감수하는 역설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론: 존재의 역설
‘비워가며 닦는 마음’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역설을 탐구하고,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천적인 가이드입니다. 지학 스님의 시적이고 깊이 있는 글은 우리에게 비움과 채움, 수수함과 평화, 그리고 자아의 다양성과 통합이라는 역설적인 관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삶의 고통과 혼란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도록 인도합니다.